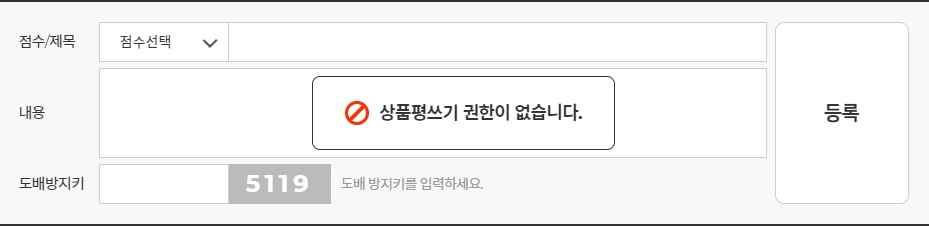바다만이 아는 대답1회 저 바다에 누워
- 등록일2020.03.27
- 회차평점
 9
9
학수는 사진 한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진은 학수의 사진첩 속에 고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열 살 먹은 소녀이었다.
소녀가 피아노 앞에 단정하게 앉아 머리만 이쪽으로 돌려 바라보고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박혜자"라고 이름 석자가 있고 일천 구백 삼십 구년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다.
실로 지금으로부터 십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햇수로 따지면, 지금 "박혜자"의 나이는 스물 한 살의 여자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수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어른이 된 혜자가 아니라 열 한살적 혜자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별같이 빛나는 까만 두 눈, 생글 생글 웃기만 하는 입,
그리고 목에 걸치고 잘 매달리던 두 손과 팔, 모두 예쁘고 귀여운 것이 었다.
이것으로써 학수는 "오빠"하고 부르며, 잘 따르던 혜자를 잊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학수가 혜자의 사진은 가지고 있는 까닭만이 아니었다.
사진 이상으로 혜자의 인상이 학수의 머리 속에 꽉 잡혀있는 까닭이었다.
여러 날이 지났다.
그 동안 혜자의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아침에 왔다가 저녁이면 서울로 다시 돌아가곤 하였다.
혜자의 아버지는 혜자를 위하여 그림책이며 동화책 같은 많은 책을 사가지고 오셨다.
혜자는 많은 책을 일일이 학수에게 보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학수는 많은 책을 볼 때마다 놀래는 것이다.
학수는 학교서 배우는 교과서 외에 별루 다른 책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그랬던 것이 혜자에게는 무척 많은 책이 있었다.
그 책들을 혜자를 위해 읽는 것도 즐거웠거니와 학수 자신에게도 마음 깊이 즐거웠던 것이었다.
며칠 후에 피아노도 보내 왔다. 뚜껑이 까맣고 반질반질 빛나는 것이었따.
학수는 피아노를 처음 봤다.
혜자는 피아노를 제 방에다 창 앞으로 가까이 놓고 심심하면 피아노를 쳤다.
학수에게는 혜자가 피아노를 잘 치는 솜씨인지 못치는 솜씨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끔 노래같은 것을 잘 쳤따.
미루어 생각하면 열살 나이로서는 피아노에 대한 재주가 비상한 것이라고
학수는 맘 속으로 놀랬다.
학수는 창 옆에 서서 혜자의 손가락이 고기처럼 뛰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곡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 말했다.
"혜자야, 피아노를 참 잘 치는구나?"
"그까짓 것 뭘, 어머니가 일찍 배워 주셨어."
혜자는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하였따.
"늬 어머니 피아노를 잘 쳤니?"
"그럼, 서울에서도 젤이었어."
"혜자야 너도 자라서 음악가가 될테니? 피아노를 잘 치는 음악가가 될테니?"
혜자는 머리를 끄덕였다.
"응, 난 커서 음악가가 될테야.
오빠야 뭐가 될테니?"
"난 소설 쓰는 소설가가 될테다."
"그래, 그것도 좋아. 오빠는 꼭 훌륭한 소설가가 될 수 있을 거야."
학수과 혜자는 창가에 가지런히 서서 그들의 빛나는 장래를 바라보듯 푸른 하늘을 바라노는 것이었다.
며칠 또 지나고 어느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학수이 전날 같이 혜자가 마중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였다.
꼭 오솔길까지 마중나와 풀 잎사귀를 따며 기다리던 혜자였다.
그리고 학수한테 오늘 뭘 배웠느냐고 열심히 물어보던 혜자였다.
"서울로 돌아갔나...?"
이런 근심이 없는배 아니었다.
"그렇지만 갑자기 서울로 갈 일은 없을텐데,
혜자 아버지가 오셔야 서울로 가도 갈 것 아닌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하고 맘속으로 따져보며 집으로 돌아와보니, 학수의 아버지가 서성거리고 있다.
학수의 아버지는 학수을 보자 말하였다.
"혜자가 병원에 갔다."
"혜자가 병원엘요?"
"응, 혜자가 오늘 아침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
"계단에서요?"
"널 찾고 있으니까 어서 가봐라."
"어느 병원이에요?"
"면사무소 옆집 병원이다."
학수는 그길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오늘 아침 혜자는 2층에서 내려오는 길에 머리가 아찔해져서 그냥 곤두박질로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병원을 찾았더니 혜자는 침상위에 누어 있었다. 얼굴에는 약간 째어진 자국이 있고, 붉은 약을 발랐다.
학수이 가까이 가니까, 혜자는 눈을 떠서 학수의 얼굴을 알아보고 "오빠야!" 부르며, 학수의 손을 꼭 잡아 당겼다.
"오빠, 어디가지 말어, 내가 자더라도 여기 있어, 응?"
하고 띄엄띄엄 말했다.
학수는
"그래, 어디 가지말고 여기 있을게..."
하고, 언제까지나 혜자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다.
|
이전회
이전회가 없습니다 |
다음회
2회 시나브로,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
작품평점 (0)점수와 평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단, 광고및 도배글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