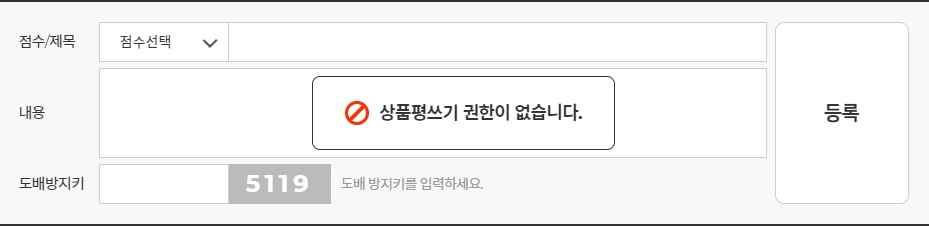인생이 가장 맛있는 순간2회 꽁냥꽁냥 스토리
- 등록일2016.07.18
- 회차평점
 9
9
흐렸던 하늘이 오늘은 맑게 개였다.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는 여윈 몸으로 짐을 꾸리느라고 서두르는 것이 민망하였다.
어머니가
"성원아, 오늘 네가 내 대신 수고를 해야겠다."
하고 일렀으나,
성원이는
'하루 쯤 안 나가는데, 큰 일이 생길까? 참...'
하고 오늘도 그냥 학교로 나가는 어머니가 좀 원망스럽게도 생각되었다.
7월이라 여름날, 아침 햇볕이 창으로 듬뿍 흐른다.
성원이는 일어선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하여,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할 수가 없었다.
툇마루로 나온다. 아버지의 이마에는 벌써 땀이 방울방울 맺혔다.
그것을 보는 성원의 눈은 흐려진다.
'가여운 아버지...'
성원이는 짐을 꾸리는 아버지의 옆으로 온다.
이사를 하는 것이었다.
짐이래야 별로 많은 것이 아니고, 이불 짐이며 책상, 책 나부랭이로 한번 옮기면
일은 끝나는 것인데 여윈 아버지에게는 힘에 넘치는 노동일 수 밖에 없다.
응당 성원이가 봐줘야 할 일인데, 성원이 자신은 이번 이사를 마음에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사를 해야 하지?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는 설움이 가슴에 북받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성원이네가 살고 있던 집은 대체로 아담하였다.
거리도 깨끗하고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더욱 좋았다.
집도 아버지가 거처하시는 방이 남쪽을 향했고, 성원이의 공부 방이 동쪽을 향했으므로 아침이 좋았다.
성원이의 나의 여덟 살 때부터 칠 년 동안이나 살아 온 집이었다.
창문 하나, 문설주 하나, 기둥 하나, 뜰 앞에 풀 한 포기까지 참으로 정다운 것이었다.
그런 것을, 이 집을 떠나서 멀리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무런 말을 안 하셨으나, 성원이는 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는 것이다.
집을 팔아버린 까닮은 묻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좀 조용한 집이 필요해...."
하고 이런 말을 몇번이고 되풀이하시는 것이었으나, 성원이는 집을 팔아버린 까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난 일요일 날, 아버지가 성원을 불렀다.
"집 구경 안 가겠니?"
하고 묻는 것이었다.
"네? 집 구경이라뇨?"
성원이는 어리둥절해서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 보았다.
아버지는 낯을 돌리면서
"이사를 하게 됐다. 그래 다른 집을 구했는데 가 보자"
하시고는 더 말 없이 앞장을 선다.
'왜 이사를 하게 됐나요....?"
하고 물으려 했으나, 아버지의 담은 입이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아 성원이는 따르기만 하였다.
돈암동에서 내려 이십 분을 걸었다. 찾아 온 집은 울타리가 낡았고 또 함석 지붕이었다.
단 두 칸 방이며 벽에는 군데군데 흙이 떨어졌다.
건물로는 차이가 대단함이 있었다. 뜰은 견주어 넓었으나 잡풀들이 한구석에 자라고 있었다.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인듯 싶었다.
성원이는 둘러 보며, 크게 놀랄 뿐이었다.
'어쩌면 이런 집일까...?'
하였다.
아버지는 집을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지붕 넘어 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흰 얼굴에는 쓸쓸함이 구름같이 떠돌고 있었다.
이사할 것은 아주 정한듯 싶었다.
어머니도 이런 말을 하셨다.
"성원이도 다 큰 나이에 집이 멀다고 학교 가길 싫어 안 하겠지..."
학교가 멀어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까짓 학교 쯤은 멀어진다고 무슨 대수겠나.
그러나 성원이네로서는 이번 이사하는 일이 어떤 속 아픈 사실을 밝히 말해 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아는 성원이는 이사에 대해서 통 말을 안 하였다.
학교에도 알리지 않았고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사하게 됐다는 말을 하기가 싫었다.
더욱이 7년을 두고 옆집에 살면서 학교에 함께 다닌 영히에게도 아무 말을 안했다.
며칠 동안에 성원이는 영히와 만나면 절로 말이 막히고 그래서 이야기를 안했다.
이야기를 안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만나는 일이 전날처럼 기쁘지않았다.
영히가 찾아오면 성원이는 한 두마디 말로 그치고 피하였다.
영히가 이사에 대한 것을 벌써 알고나 있지 않나 두려웠던 것이다.
영희로썬 성원이의 마음을 모를 일이었다.
성원이가 갑자기 말도 잘 안하는 품이 이상하고 안타까웠다.
어제는 학교 길에서 영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오는 길이니?"
"응"
성원이는 머리를 한번 끄덕여 보이고 앞서 걷는다.
영히는 언짢았으나 오늘은 꼭 알아보리라 하고 따르면서
"성원아?"
하고 부른다.
성원은 돌아본다.
"내가 기다린 게 싫어?"
하고 영히는 금방 울음이 나올 듯,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성원은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영히의 예쁜 얼굴을 마주 보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럼? 왜 요즘은 말도 잘 안해?"
"괘니"
"괘니가 뭐야?"
"영히는 몰라."
"다 알어."
성원이는 섬찍해진다.
"뭘 알어?"
"알아도 말 안할테야...."
"뭘 알어? 어서 말해."
성원이는 다시 묻는다. 영히는 머뭇거리다가
"내가 싫어서 그러지? 분명히 그렇지?"
이 말을 남기고 총총걸음으로 달아난다.
성원이는 뒷모양을 쫓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뼈가 저리었다.
저물지는 않았지만 눈 앞이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는 여윈 몸으로 짐을 꾸리느라고 서두르는 것이 민망하였다.
어머니가
"성원아, 오늘 네가 내 대신 수고를 해야겠다."
하고 일렀으나,
성원이는
'하루 쯤 안 나가는데, 큰 일이 생길까? 참...'
하고 오늘도 그냥 학교로 나가는 어머니가 좀 원망스럽게도 생각되었다.
7월이라 여름날, 아침 햇볕이 창으로 듬뿍 흐른다.
성원이는 일어선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하여,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할 수가 없었다.
툇마루로 나온다. 아버지의 이마에는 벌써 땀이 방울방울 맺혔다.
그것을 보는 성원의 눈은 흐려진다.
'가여운 아버지...'
성원이는 짐을 꾸리는 아버지의 옆으로 온다.
이사를 하는 것이었다.
짐이래야 별로 많은 것이 아니고, 이불 짐이며 책상, 책 나부랭이로 한번 옮기면
일은 끝나는 것인데 여윈 아버지에게는 힘에 넘치는 노동일 수 밖에 없다.
응당 성원이가 봐줘야 할 일인데, 성원이 자신은 이번 이사를 마음에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사를 해야 하지?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는 설움이 가슴에 북받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성원이네가 살고 있던 집은 대체로 아담하였다.
거리도 깨끗하고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더욱 좋았다.
집도 아버지가 거처하시는 방이 남쪽을 향했고, 성원이의 공부 방이 동쪽을 향했으므로 아침이 좋았다.
성원이의 나의 여덟 살 때부터 칠 년 동안이나 살아 온 집이었다.
창문 하나, 문설주 하나, 기둥 하나, 뜰 앞에 풀 한 포기까지 참으로 정다운 것이었다.
그런 것을, 이 집을 떠나서 멀리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무런 말을 안 하셨으나, 성원이는 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는 것이다.
집을 팔아버린 까닮은 묻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좀 조용한 집이 필요해...."
하고 이런 말을 몇번이고 되풀이하시는 것이었으나, 성원이는 집을 팔아버린 까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난 일요일 날, 아버지가 성원을 불렀다.
"집 구경 안 가겠니?"
하고 묻는 것이었다.
"네? 집 구경이라뇨?"
성원이는 어리둥절해서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 보았다.
아버지는 낯을 돌리면서
"이사를 하게 됐다. 그래 다른 집을 구했는데 가 보자"
하시고는 더 말 없이 앞장을 선다.
'왜 이사를 하게 됐나요....?"
하고 물으려 했으나, 아버지의 담은 입이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아 성원이는 따르기만 하였다.
돈암동에서 내려 이십 분을 걸었다. 찾아 온 집은 울타리가 낡았고 또 함석 지붕이었다.
단 두 칸 방이며 벽에는 군데군데 흙이 떨어졌다.
건물로는 차이가 대단함이 있었다. 뜰은 견주어 넓었으나 잡풀들이 한구석에 자라고 있었다.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인듯 싶었다.
성원이는 둘러 보며, 크게 놀랄 뿐이었다.
'어쩌면 이런 집일까...?'
하였다.
아버지는 집을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지붕 넘어 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흰 얼굴에는 쓸쓸함이 구름같이 떠돌고 있었다.
이사할 것은 아주 정한듯 싶었다.
어머니도 이런 말을 하셨다.
"성원이도 다 큰 나이에 집이 멀다고 학교 가길 싫어 안 하겠지..."
학교가 멀어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까짓 학교 쯤은 멀어진다고 무슨 대수겠나.
그러나 성원이네로서는 이번 이사하는 일이 어떤 속 아픈 사실을 밝히 말해 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아는 성원이는 이사에 대해서 통 말을 안 하였다.
학교에도 알리지 않았고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사하게 됐다는 말을 하기가 싫었다.
더욱이 7년을 두고 옆집에 살면서 학교에 함께 다닌 영히에게도 아무 말을 안했다.
며칠 동안에 성원이는 영히와 만나면 절로 말이 막히고 그래서 이야기를 안했다.
이야기를 안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만나는 일이 전날처럼 기쁘지않았다.
영히가 찾아오면 성원이는 한 두마디 말로 그치고 피하였다.
영히가 이사에 대한 것을 벌써 알고나 있지 않나 두려웠던 것이다.
영희로썬 성원이의 마음을 모를 일이었다.
성원이가 갑자기 말도 잘 안하는 품이 이상하고 안타까웠다.
어제는 학교 길에서 영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오는 길이니?"
"응"
성원이는 머리를 한번 끄덕여 보이고 앞서 걷는다.
영히는 언짢았으나 오늘은 꼭 알아보리라 하고 따르면서
"성원아?"
하고 부른다.
성원은 돌아본다.
"내가 기다린 게 싫어?"
하고 영히는 금방 울음이 나올 듯,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성원은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영히의 예쁜 얼굴을 마주 보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럼? 왜 요즘은 말도 잘 안해?"
"괘니"
"괘니가 뭐야?"
"영히는 몰라."
"다 알어."
성원이는 섬찍해진다.
"뭘 알어?"
"알아도 말 안할테야...."
"뭘 알어? 어서 말해."
성원이는 다시 묻는다. 영히는 머뭇거리다가
"내가 싫어서 그러지? 분명히 그렇지?"
이 말을 남기고 총총걸음으로 달아난다.
성원이는 뒷모양을 쫓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뼈가 저리었다.
저물지는 않았지만 눈 앞이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
이전회
1회 인생은 아름다워 |
다음회
3회 안아주세요 |
작품평점 (0)점수와 평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단, 광고및 도배글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