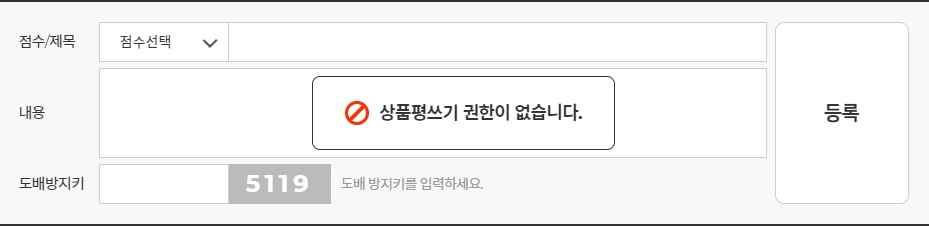내 옷장속의 코끼리2회 정리정돈은 깨끗이
- 등록일2016.07.18
- 회차평점
 9
9
어느 해에 들어서 첫 눈 내리는 날 밤이었다.
첫눈이라 하여도, 가루처럼 쌀쌀하게 부서진 그런 눈이 아니라, 꽃 이파리같은 흰송이가 소복소복 흠뻑 내리는 함박눈이었다.
저녁 녘부터 내린 것인데.. 밤이 깊을수록 이곳 골목길은 흰 눈속에 온통 묻히는 듯 싶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더욱 쓸쓸한 이 골목길-
벌써 길바닥은 발목이 잘 빠지지 않을만큼 쌓였다. 그
것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과일 가게에서 흘려오는 불빛이 길바닥을 으스름하게 비쳤기 때문으로 보였다.
그 때, 불빛 속에 한 소녀가 지나가는 것이 얼굴 보였다.
소녀는 매우 바쁜 걸음으로 흠뻑 쌓인 눈길을 미끄러지면서 골목을 더듬어 올라가는 것이었다.
한 발자국을 디딜때 마다 흰눈 길은 발목을 잡아끌어 소녀는 맥없이 넘어지고 넘어질 때 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다 보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 모양으로 미루어보면, 소녀는 끼니를 굶었는지 힘이 없는 몸으로 무엇에게 쫓기는 듯 싶었다.
소녀는 바로 가게 불빛 앞에서 미끄러져서 눈가루를 날리었다.
그러나 얼른 몸을 가누어 일어섰기 때문에 곧 가게 불빛 앞에서는 사라질 수가 있었다.
소녀는 혹시 보는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하고 돌아다 봤으나 과일 가게 안에도 사람 같은 모양은 보이지 않았다.
소녀의 두 눈은 잠시 동안 반짝였다. 소녀는 눈 길에 멈춰서서, 과일가게만을 또한 거기 쌓여있는 과일과 과자를
무척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소녀가 배고픔이 전해져 음식물을 볼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취한 태도였다.
그리고 이것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왜 그런고하니, 소녀는 곧 가게에서 시선을 돌렸고 벌써 눈 길을 더듬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동안 머물러, 소녀의 인상에 대해서 몇 마디 말을 하고 지나가자, 소녀는 나이로 보아 열 네살 가량이었고, 눈을 흠뻑 맞았으나
외투를 단정하게 입었으며, 머리도 늘어트렸다.
얼굴은 여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였으나 크고 서글서글한 두 눈에 총명이 깃들여보여 예뻤다.
다만 한가지 이상한 일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줄곧 맨발로 걸어 온 듯, 두 발은 흙과 눈이 뭉쳐서 막 더럽게 되어 있었다.
과일 가게집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어물고 다시 가게 안으로 나왔을 때에는 소녀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곳에 쓰러져 있었다.
소녀의 머리카락 위에 함박 눈이 소리없이 쌓이고 있었다.
"오빠야! 저게 무엇일까?"
하고 애리가 깜짝 놀라서 남수의 팔을 잡으면서 멈춰 섰다.
"가만...누가 눈 길에 쓰러졌는가 봐.."
남수가 조심조심히 걸어가 살펴 보면서 하는 말이었다.
"사람이야요?"
하고 애리가 다시 등 뒤에서 물었다.
"응, 사람이야, 웬 아이가 눈길에 쓰러졌어."
"아이가 눈 길에 쓰러졌어요?"
하고 애리는 남수 곁으로 가까이 와서, 눈 길에 쓰러진 소녀를 보았다.
"아이머니나, 오빠야, 계집애야."
"그래, 계집애야."
"웬 계집애가 여기서 넘어졌을까?"
"아마 집 없는 아이일거야..?"
하고 남수가 말했다.
그때 소녀는 남매가 하는 말소리로 어슴프리 정신이 드는지 조금 몸을 움직이었다.
"오빠야? 어떻게 할까?"
하고 애리가 물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야?"
"이 애를..""이 애를?"
"응,그냥 두어 두면 얼어 죽을텐데...오빠야, 아직 이애의 몸이 꽁꽁 얼지는 않았어, 숨소리도 남아있는 걸"
하고 애리는 소녀의 손목을 잡아 보고 말하였다.
그러나 남수는
"글쎄..우리끼리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아. 애리야, 저 얼른 순경 아저씨한테 알려주자."
남수가 순경이란 말을 하자,
소녀는 의식을 차리는지 몸을 뒤척이었다. 이것을 보고, 애리는
"애야, 정신을 채렸니!"
하고 소녀의 어깨를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타불타불한 머리카락 위에 쌓인 수북한 눈을 털어주었다.
그러니까 소녀는 얼굴을 들고 두리번거리면서 두 남매를 알아보고
"아!" 하고 놀래었다.
그리고
"저 봐! 누구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없니?"
하고 이런 말을 불쑥 묻는 것이었다.
"누가 뒤에서 따라온다는 말이냐?"
하고 애리가 의아해서 물었다.
그러나 소녀는 다시 입을 꾹 다물고 빛나는 두 눈동자만 또렷또렷이 애리의 두 눈을 쏘아 보다가
"넌 누구야?"
하고 째어진 음성을 높였다.
"나는 애리라고 불러."
"애리?"
"응, 여길 지나가다가 네가 넘어져 있는 걸 봤어."
"넌 나를 잡아 주려구 하지"
"잡아 주다니? 아니야, 우린 그런 것을 통 몰라.
네가 눈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서 있는 거야."
하고 애리는 간곡히 말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
하고 소녀는 남수를 가르킨다.
"우리 오빠야."
"오빠?"
"응, 나 허구 함께 지나가던 길이야."
첫눈이라 하여도, 가루처럼 쌀쌀하게 부서진 그런 눈이 아니라, 꽃 이파리같은 흰송이가 소복소복 흠뻑 내리는 함박눈이었다.
저녁 녘부터 내린 것인데.. 밤이 깊을수록 이곳 골목길은 흰 눈속에 온통 묻히는 듯 싶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더욱 쓸쓸한 이 골목길-
벌써 길바닥은 발목이 잘 빠지지 않을만큼 쌓였다. 그
것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과일 가게에서 흘려오는 불빛이 길바닥을 으스름하게 비쳤기 때문으로 보였다.
그 때, 불빛 속에 한 소녀가 지나가는 것이 얼굴 보였다.
소녀는 매우 바쁜 걸음으로 흠뻑 쌓인 눈길을 미끄러지면서 골목을 더듬어 올라가는 것이었다.
한 발자국을 디딜때 마다 흰눈 길은 발목을 잡아끌어 소녀는 맥없이 넘어지고 넘어질 때 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다 보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 모양으로 미루어보면, 소녀는 끼니를 굶었는지 힘이 없는 몸으로 무엇에게 쫓기는 듯 싶었다.
소녀는 바로 가게 불빛 앞에서 미끄러져서 눈가루를 날리었다.
그러나 얼른 몸을 가누어 일어섰기 때문에 곧 가게 불빛 앞에서는 사라질 수가 있었다.
소녀는 혹시 보는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하고 돌아다 봤으나 과일 가게 안에도 사람 같은 모양은 보이지 않았다.
소녀의 두 눈은 잠시 동안 반짝였다. 소녀는 눈 길에 멈춰서서, 과일가게만을 또한 거기 쌓여있는 과일과 과자를
무척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소녀가 배고픔이 전해져 음식물을 볼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취한 태도였다.
그리고 이것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왜 그런고하니, 소녀는 곧 가게에서 시선을 돌렸고 벌써 눈 길을 더듬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동안 머물러, 소녀의 인상에 대해서 몇 마디 말을 하고 지나가자, 소녀는 나이로 보아 열 네살 가량이었고, 눈을 흠뻑 맞았으나
외투를 단정하게 입었으며, 머리도 늘어트렸다.
얼굴은 여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였으나 크고 서글서글한 두 눈에 총명이 깃들여보여 예뻤다.
다만 한가지 이상한 일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줄곧 맨발로 걸어 온 듯, 두 발은 흙과 눈이 뭉쳐서 막 더럽게 되어 있었다.
과일 가게집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어물고 다시 가게 안으로 나왔을 때에는 소녀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곳에 쓰러져 있었다.
소녀의 머리카락 위에 함박 눈이 소리없이 쌓이고 있었다.
"오빠야! 저게 무엇일까?"
하고 애리가 깜짝 놀라서 남수의 팔을 잡으면서 멈춰 섰다.
"가만...누가 눈 길에 쓰러졌는가 봐.."
남수가 조심조심히 걸어가 살펴 보면서 하는 말이었다.
"사람이야요?"
하고 애리가 다시 등 뒤에서 물었다.
"응, 사람이야, 웬 아이가 눈길에 쓰러졌어."
"아이가 눈 길에 쓰러졌어요?"
하고 애리는 남수 곁으로 가까이 와서, 눈 길에 쓰러진 소녀를 보았다.
"아이머니나, 오빠야, 계집애야."
"그래, 계집애야."
"웬 계집애가 여기서 넘어졌을까?"
"아마 집 없는 아이일거야..?"
하고 남수가 말했다.
그때 소녀는 남매가 하는 말소리로 어슴프리 정신이 드는지 조금 몸을 움직이었다.
"오빠야? 어떻게 할까?"
하고 애리가 물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야?"
"이 애를..""이 애를?"
"응,그냥 두어 두면 얼어 죽을텐데...오빠야, 아직 이애의 몸이 꽁꽁 얼지는 않았어, 숨소리도 남아있는 걸"
하고 애리는 소녀의 손목을 잡아 보고 말하였다.
그러나 남수는
"글쎄..우리끼리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아. 애리야, 저 얼른 순경 아저씨한테 알려주자."
남수가 순경이란 말을 하자,
소녀는 의식을 차리는지 몸을 뒤척이었다. 이것을 보고, 애리는
"애야, 정신을 채렸니!"
하고 소녀의 어깨를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타불타불한 머리카락 위에 쌓인 수북한 눈을 털어주었다.
그러니까 소녀는 얼굴을 들고 두리번거리면서 두 남매를 알아보고
"아!" 하고 놀래었다.
그리고
"저 봐! 누구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없니?"
하고 이런 말을 불쑥 묻는 것이었다.
"누가 뒤에서 따라온다는 말이냐?"
하고 애리가 의아해서 물었다.
그러나 소녀는 다시 입을 꾹 다물고 빛나는 두 눈동자만 또렷또렷이 애리의 두 눈을 쏘아 보다가
"넌 누구야?"
하고 째어진 음성을 높였다.
"나는 애리라고 불러."
"애리?"
"응, 여길 지나가다가 네가 넘어져 있는 걸 봤어."
"넌 나를 잡아 주려구 하지"
"잡아 주다니? 아니야, 우린 그런 것을 통 몰라.
네가 눈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서 있는 거야."
하고 애리는 간곡히 말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
하고 소녀는 남수를 가르킨다.
"우리 오빠야."
"오빠?"
"응, 나 허구 함께 지나가던 길이야."
|
이전회
1회 문을 여세요 |
다음회
3회 내사랑 울보 |
작품평점 (0)점수와 평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단, 광고및 도배글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